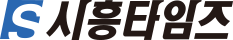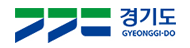[시흥타임즈=글: 김경민] 한국에는 해마다 수백 개의 ‘지역특화축제’가 생긴다. 맥주, 와인, 커피, 음식, 꽃, 음악, 빛을 주제로 한 축제들이 지자체마다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된다. 축제 이름은 다르지만,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무대, MC, 초청 가수, 현수막, 푸드트럭, 체험 부스, 그리고 언론 기사에 등장하는 마지막 평가지표는 언제나 하나의 숫자, 바로 ‘참가 인원’이다.
이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예산의 방향도, 기획 구조도, 축제의 성격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컨셉 축제’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연예인을 대동한 동원형 행사에 가깝다. 지자체의 문화관광 예산은 결국 연예기획사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한국의 축제는 ‘컨셉’을 이야기하면서도 끝내 연예인 섭외 경쟁으로 귀결된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 평가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다. 참가 인원만 많으면 모든 비판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국내 축제 정책의 기본 구조다.
국내 축제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키우기보다 유명 가수를 불러 ‘한 방’에 관객을 모으려 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출연료로 소진되고, 축제의 본래 컨셉은 약화된다. 지자체는 방문객 수를 성공의 유일한 잣대로 삼고, 그 결과 단기적인 흥행에 매몰되어 지역 고유의 서사를 쌓지 못한다. 오래가는 축제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다.
이 구조 안에서는 어떤 축제도 진정한 ‘특화’가 될 수 없다.
축제를 ‘인원 동원 수’로 평가하는 순간, 축제는 문화가 아니라 행사가 된다. 도시는 브랜드가 아니라 무대 세트가 된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은, 축제(Festival)는 문화(Culture)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축제는 문화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이며, 행사는 목적 수행을 위한 수단이다. 축제는 이야기(스토리텔링)를 바탕으로 전통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도시와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지속성을 만들어낸다. 반면 행사는 모객 자체를 목표로 하는 일회성 이벤트에 가깝다.
안타깝게도 전국 어디를 가도 같은 무대, 같은 가수, 같은 동선, 같은 부스, 같은 야시장, 같은 사진, 같은 기억만 남는다. 예를 들어 지역마다 수많은 맥주축제가 있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마치 지난주에 다녀온 다른 지역의 맥주축제를 다시 방문한 듯한 기분이 든다.
왜 대한민국의 축제는 오래 남지 않을까. 답은 단순하다. 기억이 아니라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축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유럽에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이지만 컨셉이 매우 강한’ 축제들이 문화적 저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이 축제 선진국인 이유는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와 라이프스타일이 축제라는 형식을 통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잠깐 반짝이는 이번 달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는 영원한 베스트셀러, 즉 명작(클래식)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그 지역만의 서사이자 이야기이며, 정체성이자 자부심이다.
스페인 부뇰의 ‘라 토마티나(La Tomatina)’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 인구 1만 명 남짓한 작은 마을 전체가 붉게 물드는 토마토 축제다. 토마토를 던진다는 단순하지만 파격적인 컨셉 하나로 전 세계 여행자를 끌어모은 대표적인 ‘컨셉 중심’ 축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카니발(Carnevale di Venezia)은 ‘가면’이라는 강력한 상징을 통해 계급을 숨기고 평등하게 즐기던 전통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우아하고 신비로운 축제로 남아 있다.
영국 에든버러의 프린지 페스티벌(Fringe Festival)은 “누구나 공연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컨셉으로 시작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무대로 바꾸었다. 대규모 자본보다 ‘아이디어’와 ‘예술성’이 핵심인 축제다.
그렇다면 유럽은 왜 축제 선진국인가. 한국의 축제가 종종 지자체의 실적을 위해 ‘관 주도’로 기획되어 비슷비슷한 모습이 되는 반면, 유럽의 축제는 수백 년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즐겨온 문화가 자연스럽게 축제로 굳어진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축제를 기획할 때 사례 연구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유럽의 축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사’가 아니라, ‘왜 토마토를 던지는지’, ‘왜 가면을 쓰는지’에 대한 역사적 서사(Narrative)가 탄탄하다.
축제는 특별한 이벤트를 넘어, 그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Identity)을 확인하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독일의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 역시 국가나 도시 단위가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출발한 축제다.
K-문화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정작 자국의 축제는 후진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세계적인 축제의 기본 방향은 작지만 분명한 서사를 가진 ‘강한 컨셉 중심’이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구조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축제 평가 기준에서 ‘참가 인원’이라는 항목이 사라져야 지역특화축제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 글쓴이 김경민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창업과 소비 트렌드를 가르치며, 세계커피콩축제 감독, 세계커피연구소장, 아마추어작업실 대표를 맡고 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에서 커피 인문학·커피 트렌드·브랜딩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커피학 석사를 받았다.
[자유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흥타임즈는 독자들의 자유 기고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